재호형의 전화를 받았다. 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희망이나 연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형은 20년전에 형수를 떠나 보냈다. 유방암이었다. 딸 아이가 갓 두 살이 되던 해였다.
형은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지금까지 훌륭히 키워냈다.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다. 엄마를 몹씁병 때문에 잃은 탓인지 아이는 의대를 진학했다. 형은 유일한 혈육이자 일생의 동지였던 딸 아이를 멀리 서울에 보내놓고 혼자서 버섯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 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었다.
지난 겨울이었다. 방학을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온 아이가 우리병원에 들렀다. 전날 아빠 농장에 일을 돕다가 다리를 조금 다쳤다는 것이다. 특별한 외상의 흔적은 없었지만 아랫다리가 많이 부어있었다. 아이에게 물리치료를 처방하고 약간의 소염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런데 아이의 부은 다리가 일주일이나 호전되지 않았다. 다시 자세히 문진을 해보았더니 다리가 이렇게 부은 것은 몇 달된 일이라고 했다. 다만 타박상을 입은 후에 조금더 심해진 것 같다고 했다.
혹시나 신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서 아이를 초음파 검사실로 데리고 갔다.
신장에 특별한 이상이 있을 나이가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상복부에 초음파 프로브를 가져다 대는 순간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림이 나타났다. 아이의 간에 무려 20센티는 될만한 커다란 덩어리가 보이는 것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입에 침이 마르르는 것이 느껴졌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간종양 이었다.
다만 양성이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었다. 아니 반드시 그래야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다시 초음파를 대보았지만 양성이기를 바라는 내 희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아이를 집에 보내고 재호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 도착한 형에게 종합병원에서 CT 촬영을 하도록 소견서를 쥐어주었다. 형의 표정은 마치 유령처럼 온기가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형이 가져온 결과지에는 아이의 그것이 악성임을 가리키는 헤파토마 (Hepatoma)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형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쳐다 볼 수가 없었다. 형은 비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 내가 살릴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릴거야, 우리나라에서 안되면 미국가서라도 살릴거야..’. 그렇게 다짐하는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길로 형은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고, 3 주후에 형이 다시 나를 찾아왔다. 전원한 병원을 통해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그냥 형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암 덩어리에 주입하는 치료만 받은 후 다시 집으로 내려왔다. 수술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 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난 후 아이가 형의 곁을 떠났고, 그후로 형은 말을 잃어 버렸다. 이 모든 것이 불과 몇 달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 형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싶은데 학교에 대신 좀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형은 차마 아이가 다니던 교정을 다시 볼 자신이 없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딸을 보냈지만 대신 그 아이의 친구들에게 남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승화’라고 부르는 그 아름다운 단어의 참 뜻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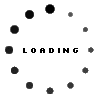
댓글2개